백색 공간
안희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쓰면
눈앞에서 바지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한참을
서 있다 사라지는 그를 보며
그리다 만 얼굴이 더 많은 표정을 지녔음을 알게 된다
그는 불쑥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독한 폭설이었다고
털썩 바닥에 쓰러져 온기를 청하다가도
다시 진흙투성이로 돌아와
유리창을 부수며 소리친다
“왜 당신은 행복한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절벽이라는 말 속엔 얼마나 많은 손톱자국이 있는지
물에 잠긴 계단은 얼마나 더 어두워져야 한다는 뜻인지
내가 궁금한 것은 가시권 밖의 안부
(생략)
-시집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 (창비, 2015)
【시인 소개】
안희연 / 1986년 경기 성남 출생. 2012년 《창비》 신인 시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 시작. 시집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등이 있음.
------------------------------------------------------------------------------------------------------------------------------------------------------------------------------------------------------------------------------------------
신문에 시를 소개하는 일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시의 분량이 적당해야 하고, 비교적 내용이 쉬워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길어서 분량이 적당한 시를 고르기도 어렵지만, 내용이 쉬운 시들은 대개 작품성이 떨어져서 추천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적당하다’는 것처럼 쉬우면서 어려운 게 없지요.
이 시는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백색 공간>이라는 제목도 아리송하고, 내용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해설해서 산문으로 풀어놓으면 독자들이 이해하기는 수월하겠지만, 그건 바람직한 시 읽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산문으로 풀어놓는 순간 풀어진 산문만 남고 시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그리 난해한 시가 아닙니다. ‘나’와 ‘그’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라고 격려하는 것도, 춥다고 “온기를 청하”는 것도, “왜 행복한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자학만 하느냐고 다그치는 것도 바로 시인 자신입니다. 대부분의 시는 시인 자신의 이야기를 낯선 방식으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타인의 삶을 엿보게 되고, 세상살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일상의 어법을 벗어나는 방식이어서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시를 끙끙대면서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에 맛들이면 한눈에 읽히는 쉬운 시는 싱거워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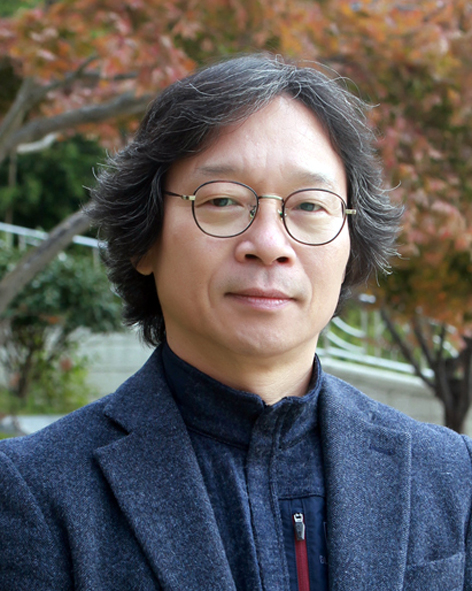
(김남호 / 문학평론가)


